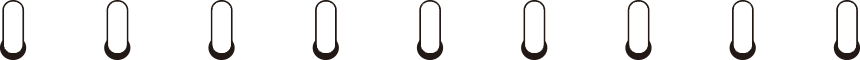


-

-
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듯하면서도, 그 전조는 은밀하게 번져 있다. 아직은 진한 초록이 거리의 나무를 지배하지만, 잎사귀 끝자락에 묻어나는 노란빛은 서서히 계절의 무게를 알린다. 출근길, 스치는바람 속에 묘하게 차가운 결이 스며들 때, 나는 내가 인생의 여름을 건너 가을에 닿아 가고 있음을 직감한다.
마흔이라는 나이는 여름의 푸른 생기를 아직 품고 있으면서도, 이미 여러 번의 계절을 지나온 흔적을 감출 수 없다. 청춘의 한가운데에서 무심히 흘려보냈던 시간들은 이제 내 어깨 위에서 하나의 결로 자리 잡고, 더 이상 무모한 속도로 달리지는 못하게 한다.
대신, 천천히 걸으며 풍경을 오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준다.
노랑과 초록이 동시에 머무는 잎은 마치 과거와 미래가 겹쳐진 한순간 같다. 끝나 버린 것 같으면서도 아직 남아 있는 계절, 떠나려 하면서도 머무는 빛깔. 나는 그 사이에서 불안과 안도를 동시에 느낀다. 그러나 언젠가 모든 것이 노랑으로 물들 듯, 내 삶 또한 서서히 새로운 색으로 옮겨 갈 것이다.
가을은 쇠락이 아니라 농익음이다. 햇살은 차분해지고, 바람은 결을 더하고, 풍경은 깊이를 얻는다. 그렇게 다가오는 계절은, 사라짐이 아닌 채움으로 나를 맞이한다. 서울의 가을 하늘 아래, 나는 노랑과 초록 사이에 서서, 아직 남은 푸르름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다가올 빛깔을 담담히 기다린다.

